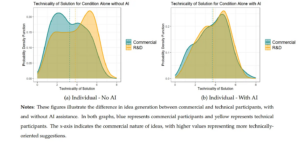익숙하지 않은 곳에서의 하룻밤. 낯선 공기, 낯선 침구, 낯선 소리들 속에 몸을 누이면, 오히려 마음은 오래된 기억처럼 느긋해진다. 그곳의 냄새를 맡고, 그곳의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는다. 씹는 동안, 입안은 그 땅의 햇살과 바람, 사람의 손길을 천천히 떠올린다. 그것이 여행 아닐까. 장소를 옮긴다는 행위보다, 삶의 리듬을 조금 비틀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새로운 숨결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여행은 늘 멀리 있어야만 하는 걸까. 비행기 시간에 쫓기고, 굳이 유명한 장소를 골라 분 단위로 움직이며, 피로한 몸을 끌고 사진 속 표정을 짓는 일. 배는 이미 부른데도, 유명하다는 이유로 음식을 욱여넣고 돌아서는 일 – 그건 마치, 기억이라는 이름의 창고를 무리하게 채우려다 결국은 넘쳐버리는 감정 같았다. 결국, 남는 건 사진뿐인 그런 여정은 어쩌면 ‘경주’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겐 다른 정의가 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면, 나는 문득 관악산을 떠올린다. 그 산의 숨겨진 작은 봉우리 하나. 나만 알고 싶은 공간. 둘이 앉기엔 좁고, 혼자 앉기엔 딱 좋은 크기. 혼자 산을 오른자에게만 허락된 자리. 거기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머물 수 있다. 그 시간이 내겐 여행이다.
그 장소를 처음 본 날이 기억난다. 국기봉, 그 육봉의 어느 능선에서였다. 마치 바위 위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바람만이 그의 옷자락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게는 한 장의 수묵화처럼 각인되었다.
그 후, 나는 거의 매주 산을 오른다. 땀이 흐르고 숨이 차오를수록, 그 고요한 곳에 다가가는 느낌이 든다. 집에서 나서면 정확히 한 시간이 걸린다. 이제는 등산로의 굴곡도, 바위의 표정도 손바닥처럼 익숙하다.
오늘은 특히 맑았다. 영종도 너머의 수평선까지 또렷하게 보였다. 바람은 거칠었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은 그 자체로 선물 같았다. 하늘은 오늘, 스스로의 색을 되찾은 듯 단단하고 푸르렀고, 구름은 마치 흩어진 호흡처럼 하늘에 닿아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흙의 냄새와 바람의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부스럭임 사이에서, 삶의 무게가 천천히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곳에 앉아 한 시간쯤 멍하니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바람이 스치는 소리, 먼 산의 능선이 그리는 윤곽, 그리고 내 안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고요함을 느끼며.
도시의 삶은 쉴 틈 없이 우리를 밀어붙인다.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하지만 산 위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순간은 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행을 했다. 먼 곳이 아니어도 좋았다. 값비싼 식사도, 유명한 명소도 필요 없었다. 내 몸을 이끌고, 내 마음을 데리고, 조금 더 하늘 가까이에 다가간 것.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들여다본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여행은 거창하지 않다. 익숙한 일상에서 살짝 비껴난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진심.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우리는 진짜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행이 별거인가 싶다.
그저 나를 나에게 데려다주는 일, 그것이면 족하다.
– 25.03.30 –